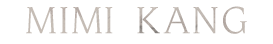ㆍABOUT/Artist Statement
여기, 네 개의 눈이 있다.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보기 위해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길쭉한 피부를 잔뜩 위로 들어 올리면 검은 눈동자가 딸려 올라온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눈을 뾰족하게 뜨고 이 두 눈은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간격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며 움직일 공간을 탐색한다.
라디오 안테나를 세우는 것처럼 두 개의 눈이 아주 길어지고 멀어졌다. 잔뜩 힘을 준 두 눈과 함께 발걸음이 빨라진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일까? 저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표가 명확한 듯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는 듯 맹수가 사냥감을 노리듯 사납게 나아간다. 아 저 두 눈에 찔릴 것만 같은데. 덩달아 나도 긴장한다.
세 번째 눈과 네 번째 눈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첫 번째 눈과 두 번째 눈 아래에 위치하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 그늘에 자리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날에는 위에 있는 두 눈을 작게 움츠리고 새로 난 눈으로 슬그머니 보기 시작했다. 그늘 속에서 본다는 것은 틈과 여백, 비어있는 곳을 보는 것이었다. 숨을 마시는 것과 같이 내가 마시는 공기를 피부의 안과 겉으로 읽는 것이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땅속에 들어갔다. 네 개의 눈을 모두 감고 몸을 아래로 향했다. 그곳은 눈 시린 하얀 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거나, 눈 뜰 수 없이 강한 찬 바람을 막아주었다. 온몸의 긴장을 풀고 잠에 든다. 눈과 눈 사이의 긴장을 툭 내려두고 들숨과 날숨이 균일하게 호흡한다. 손톱만큼 작은 무언가 아삭아삭 내 살을 파먹기도 하지만 아직은 일어날 때가 아니다. 더 자고 싶어 더 작게 더 더 작게 몸을 웅크린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더 깊은 단잠에 빠진다.
비가 내렸나 보다. 서늘한 공기가 스물스물 다가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물을 머금는다. 까슬한 모래알이 물과 만나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 사이사이 헤엄치고 싶은 들뜬 마음에 살며시 기지개를 켰다. 동그란 몸에 손이 돋아났다. 조금씩 조금씩 흙을 한 줌 밀어내니 몸이 앞으로 나아갔다. 더 보드라운 곳을 향해 흙을 계속 밀어냈더니 다시 땅 위로 올라왔다. 첨벙첨벙 내 걸음마다 소리가 났다. 오랜만에 딛는 땅의 소리. 빨라졌다가 느려지며 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앗, 너무 신이 났나. 네 개의 눈이 잔뜩 길어져 춤을 추고 있었다.
한참 움직였더니 배가 고팠다. 향긋한 냄새에 물기 가득한 잎을 먹었다. 여린 잎이 말했다. ‘나는 나무가 되고 싶었다.’라고. 그 말 한마디까지 모두 먹었다. 내가 먹은 것들이 내가 되어 나도 나무가 되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무를 찾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