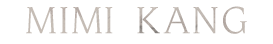ㆍARCHIVING/Critics
Critic. 박정수
지금 글을 쓰는 필자 자신, 이 글을 읽을 독자 모두는 무수한 뼈와 피와 살을 밟고 서 있다. 그 고통을, 죄책감을, 송구스러움을 일일이 의식한다면 아마도 인간은 삶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뻔뻔하게도 모든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일부는 기억하면서도 나머지는 털어내고 잊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하지만 망각하고 또 망각하여, 무수한 타자의 죽음이 내 삶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존중·배려마저 손아귀에서 놓아버린다면, 우리는 인두겁으로는 살되 인간으로선 살지 못 한다. “적당히 기억하고 적당히 망각하라”, 참으로 쉬워 보이는 삶의 명제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세태는 나쁜 것은 모조리 잊고, 좋은 것만 간직하도록 도처에서 유도하니 말이다. 그런 와중에 묵묵하게 제 삶을 떠받치는 존귀한 타자의 존재와 자연이라는 거대한 근원 내지는 요람을 줄곧 환기하며 살아가는 작가가 있다. 바로 강미미 작가다.
‘선’, 참으로 가냘프고 흐릿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선, 그러나 바로 그 선 하나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뒤바꾼다. 그림에서의 윤곽선은 너와 나, 생물과 무생물, 이쪽과 저쪽을 결정하고, 현실에서도 얇디 얇은 선 하나가 동, 구, 시, 도, 나라의 개념을 결정한다. 별거 아닌 그 선 하나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 어떤 규정을 따르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강미미 작가는 일상과 구분되는 화폭, 갤러리라는 선에 더해 또 하나의 선을 설정한다. 바로 ‘삼각형’이라는 선이다. 그 선에 물방울, 감자, 잡초 등 인간이 덜 주목하거나, 때로는 쉽게 짓밟고 지나쳐버리는 소박한 현상, 자연물들을 담아낸다. 강미미 작가의 선 안에서 당연한 것들은 당연하지 않게, 지나쳐버린 것들은 응시해야 할 대상으로 뒤바뀐다.
강미미 작가의 선은 그려지고 또 그려지다가 ‘삼각형’을 이룬다. 강미미 작가는 삼각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삼각형은 주로 표지판, 경고판 등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삼각형을 이루는 선들은 감상자들에게 자신 안에 담긴 피사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며, 때론 “나로 인해 당신이 지금 저를 바라보고 서있지 않습니까!”라며 나와 너, 모두의 삶을 환기한다.
또 강 작가는 삼각형이 가진 날카로운 세 개의 꼭지와 그 조형성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그 삼각형의 방향을 중심으로 빗방울은 아래로 내려 꽂혀지기도 하고, 식물들은 뻗어나가기도 한다. 강미미 작가의 선은 그 누구도 조형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대상들을 들여다봄을 넘어서, 그 피사체들이 향하게 될 운동성을 암시하며,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회화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부동하기에 움직이는 삶을 오롯이 담아낼 수 없는 슬픈 회화의 한계를 자신만의 문법으로 극복한다.
‘색’, 강미미 작가의 색 뭉치는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정적이다. <빛을 향한 날갯짓>, 애석하게도 육지로 튀어나와 버린 날치는 물살이를 거부하는 메마르고도 퍽퍽한 땅 위에서 어떻게든 버텨내고 돌아가려는 최후의 몸부림을 보여준다. 이때 강미미 작가의 색 뭉치는 아주 격렬하게 변한다. <새벽에 자라나는 손>,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필치로 그려진 커튼과 대비를 이루는, 괴괴하고도 거친 필치로 형상화된 날카로운 손아귀가 튀어나오고 있다. <몸의 주장>, 몸을 주장하는 것은 그림 속 평화로운 비둘기가 아니다.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곧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한 잔상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흩어져가는 자신의 편린을 붙잡으며 존재한다고, 아마도 목전에는 존재했노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세 작품에서 거친 필치는 공통적으로 무(無), 죽음, 소멸 등에 상응한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필치는 당연하게도 삶을 응시하는가? 그렇지만은 않아 보인다. <창백한 새벽>, 평온하고도 고요한 순간, 앞서 본 위기와 처절함과 거친 몸짓과는 딴판인 풍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역으로 그 풍광에 삶은 희미하고도 아스라하다. 잔잔한 필치로 그려진 인간은 미동 없이 잠들어있고, 그 너머에 나무는 마치 창백하게 누운 인간을 거름 삼아 자라나는 것만 같다. 즉 평온한 필치 속에서는 삶을 느낄 수 없다. 오히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붙잡으려는 존재의 의지와 갈망과 간절함과 처절함이 요동치는 반면, 어떤 위기도 없는 고요한 풍광은 죽음의 창백함이 내려앉으며 삶을 잠식한다.
애석하지만 삶과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닥쳐온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삶의 갈증과 평온함을 갈망하겠지만, 그 안온함 속에서 삶은 태만하다 못해 소중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상실한다. 그래서 그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건들을 지속해서 상기하고, 또한 그 삶을 위해 희생된 무수한 생명체들을 상기하며 죽음으로써 존귀한 삶임을 인지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도 늘 자연과 교응하며, 사소하고 소박하다고 여겨지는 생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불가피할 땐 기리며 살아가는 강미미 작가의 캔버스는 그 철학의 확장된 장이다. 작가의 캔버스는 죽음을 기리는 의례이자 기억해야 할 존재들의 박물관, 그 행위들로 환기되는 소중한 삶이 오가는 통로다.